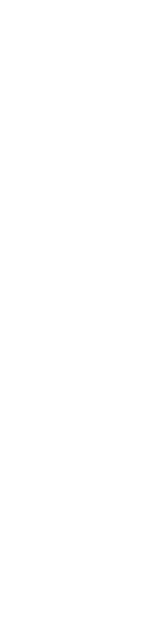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행의 서막을 알렸고, 이르쿠츠크로 가는 열차에 올라타면서 긴긴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열차에 타기 전 부터 나에게 관심을 보인 울란우데 출신 '칭기즈'와 그의 동료,
열차 맞은 편에 탄 이름 모를 연금수령자와 사할린 섬 여행하고 고향으로 복귀하는 시크한 아저씨,
가족여행으로 온 듯한 여러 사람들...
쾌활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았고, 더군다나 러시아어도 막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
수많은 유튜버가 보여준 낭만적인 모습과는 사뭇 달랐던 여행이었다.
그래도 그 나름대로 만족스러웠다 생각이 된다. 좋은 인연을 만났다는 것은 매 한 가지니까.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소홀히 하는 편이라 지금까지도 그 인연이 이어지진 않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르쿠츠크 역까지 장장 3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나름 젊은 패기에 (당시 25살이었으니) 표를 예매했을 땐 3일이면 굉장히 짧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3일을 기차 안에서 지내보니 3일이라는 기간은 정말 길었다.
샤워도 하지 못해(샤워를 할 순 있었지만 캐리어를 열기가 귀찮았다.) 머리는 머리대로 떡지고
말이 잘 통하지 않기에 의사소통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잠은 잠대로 잘 수가 없어서 여러모로 불편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래도 다른 칸에서 이따금씩 찾아오는 칭기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캄차카에서 어부일 하다가 고향으로 가는 아저씨들과 아주머니들과 막판에 한국 여행객 통역해주면서 친해지면서
마냥 고통스러운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 다행스럽긴 했다.

칭기즈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몽골계 러시아 소수민족인 부랴트인이고,
한국에서 일하다가 배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간 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기차 타고 울란우데로 가는 사람이었다.
당시 한국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무려 횡단 열차를 타기 전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원래 본업은 화가였으나, 아무래도 그림 그려 돈 벌어먹는 게 힘들겠지, 더군다나 모스크바가 아니라 울란우데에서 활동한다면...
러시아에서 돈벌이도 변변치 않아 한국으로 일하러 간 듯했다.
생 부랴트인이라 그런지 부랴트 말도 조금 할 줄 알았고,
나름대로 자신의 민족에 자긍심이 있는 사람이라 부랴트어를 할 줄 모르는 울란우데 쪽 아이에게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러시아어를 조금씩 가르쳐주기도 했고, 푸쉬킨의 예언자라는 시를 써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시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림을 그려주면서 까지 이해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뭔가 의미가 확 오지 않아 이해를 못한 내색을 보이자 씁쓸해하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맞은편 좌석 남자분께
내가 외국인이니 잘 챙겨달라는 말을 누누이 하셨다. (그러실 필요는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 두 명이서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듯했는데,
유추컨대, 왜 굳이 다른 나라 나가서 일을 하느냐는 식으로 핀잔을 준 것 같았다.
그 외에도 사할린은 볼 게 많이 없었다면서 오고 가는데 시간만 낭비했다는 그런 말도 했던 것 같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거의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무튼, 그렇게 무뚝뚝하면서도 은근히 나를 챙겨주기도 했고,
서로 고향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 아저씨는(이름을 까먹었다...) 자신이 사는 오룔(Орёл)이라는 도시를 보여줬고
나는 서울과 부산, 그리고 거제 사진을 보여줬다.
현대적인 건물이 번쩍번쩍 빛나는 사진을 보고 흥미를 꽤나 가지셨다.
나랑은 직접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같이 있는 자리가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던 걸로 기억난다.

열차 안에 있는 아이들이랑 마피아 놀이를 하기도 했고, 보드 게임하는 걸 구경하기도 했다.(할 줄 몰라서...)
같이 찍은 사진이 없어서 정말 아쉽긴 했지만, 나름대로 재밌었다. 마피아 게임을 원활하게 할 정도의 러시아어 실력을 갖추지 못해
많이 주절대는 사람을 지목하고 얘가 마피아야! 너무 많이 씨부려! 이러면서 몰아세우기도 했다.
마피아 놀이는 한국에서 하는 것과 거의 똑같았다. 마피아, 시민, 경찰, 의사 이렇게 있는 상태로 하니까.
그때 같이 게임을 했던 친구들이 나를 제외하고 6명인가 그랬는데 전부 다 아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았다.
열차에서 다 친해진 느낌?
모두 울란우데 쪽에서 다 내리고 나니 어떤 러시아 사람이 나한테 나가오 더니 나보고 한국인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니 자기 쪽에 한국인이 있는데 통역 좀 해달라고 나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웬 한국인 여성분이 러시아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더라.
어쩐지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설마설마하고 말을 안 걸다가 한국인인 걸 제대로 알고서야
마치 코를 풀어내듯 한국어를 풀어냈다. 그분도 이르쿠츠크로 가시는 분인데, 리스트비얀카였나 아무튼 거기로 간다고 하더라.
러시아 전래동화 같은 거 아는 거 있냐, 얼마나 러시아어 배웠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런저런 질문 세례를 받고는
러시아 카드게임인 두락(Дурак)을 했는데, 나도 통역을 못하자 일단 하면서 배우자면서
나랑 한국인 여성분이랑 아무거나 지레짐작하며 내곤 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나는 패를 들 테니 너네들이 게임을 즐겨라는 식으로 진행이 흘러갔다.
지금 시점에서 이 게임을 하라면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데(카자흐스탄에서 보드카 마시면서 배운 지라...)
좀 배워갈 걸 그랬나?

그렇게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바이칼 호수가 나왔다. 물론 해가 거의 질 무렵이라 잘 보이진 않았다.
이제 이르쿠츠크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 잠도 오고 그러니 잠을 자러 갔다.
얼마 안 잔 것 같은데 승무원이 도착 20분 전에 나를 깨웠다.
이르쿠츠크 도착할 때쯤 깨워달라는 맞은편 아저씨도 깨우고 이르쿠츠크에 내려 사람들과 작별인사를 했고
한국인 여성분 택시 잡는 거 러시아인이랑 같이 도와주고 그분들과도 작별인사를 했다.
그렇게 이르쿠츠크에 도착하니 새벽 3시 반 정도 되었다.
아침에 알혼섬에 있는 숙소로 가는 픽업차량이 온다고 하니 폰도 충전하다가 잠시 선잠을 청했다.
아침 9시쯤에 온다고 그랬는데 버스 기사가 엄청 지각해버리는 바람에 거의 10시쯤에 탄 것 같다.
그때까지 뭐했냐면, 아무것도 안 했다. 역 주변을 서성대다가 다시 들어가 앉아 있다가를 한참을 반복했다.
버스가 늦게 도착한 바람에 짜증이 엄청 난 상태였는데 갑자기 어떤 남성분이 내게 다가와 죤기혼크? 하고 소리치는 것이다.
처음엔 응? 하다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걸 알아채고선 다! 다! 하고 소리치고는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차에 탔다.
몇몇 게스트하우스와 호텔을 돌면서 사람들을 더 태우고 알혼섬으로 향했다.
소요시간은 거의 8-9시간가량 걸렸다.

알혼섬으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선착장까지 가서야 느꼈다.
중국인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았다.
그때 바이칼 호수에 관한 노래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다나 뭐라나...
같은 버스에 탄 한국분이 설명해 주시더라.
3일 8시간 만에 알혼섬에 도착했고, 조금 쉬고 싶었지만 한국 여행자분들과 호수변에서 만나기로 해서 짐 정리하고 바로 나갔다.
기차에서 찍은 사진 몇 개만 올리면서 포스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